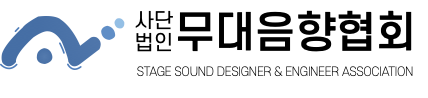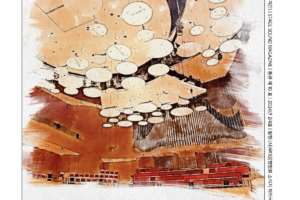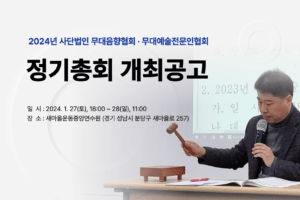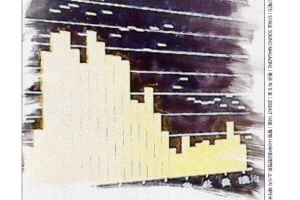피아노의 건반이 어떤 소리를 내야 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 어떤 현대 음악가가 달리 조율하여 사용했더라도 A4 건반의 현은 결국 다시 440Hz 혹은 442Hz로 조정되리라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라고 부르고 반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본래 전혀 다른 음 높이나 음색을 가진 악기였다면 지금의 모양, 재료, 크기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소리를 내기위해 오랜 시간 발전을 거쳐 온 악기가 피아노이니까요. 검고, 무겁고 큰 덩치의 피아노는 참 안정적인 인상을 주지만 사실 불안정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맞지 않으면 어느새 쪼개지고 뒤틀립니다. 88개의 건반에 할당된 소리가 끊임 없이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피아노를 소유한다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조율은 본래 목적했던 바를 향한 끊임없는 성찰처럼 보입니다. 공연장의 조율은 매번 연주 때마다, 심지어 연주 도중에도 이루어져야하는 번거롭고 불편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비로소 처음 만들어진 목적의 완성을 향한 첫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는 결코 존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번 올바르지 않은 소리만 낼테니까요.
한편으로,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새로움과 창조가 440Hz라는 구속 혹은 틀을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개인의 삶과 조직의 일상도 조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참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높은 성취를 얻기 위해 조율이나 정비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몸 어딘가 불편해져 병원에 가서야 내 삶을 돌아보고, 조직에서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고 나서야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되짚어보게 되기도 하지요.
어쩌면 돌아볼 여유는 스스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과 여건이 돕지 않는다면, 또 함께하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이제 우리의 공연장들도 꽤 오랜 역사를 쌓아 왔고, 또 공연장을 구성하는 우리들도 충분히 훌륭히 역할을 지켜내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이제는 내가 몸담은 곳, 이 거대한 악기가 본래 어떤 소리를 내도록 설계되었는지, 또 내 일상을 이루는 부속품들이 어긋나고 삐걱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적당한 시간이, 마치 공연 전의 조율처럼 당연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

문 성 욱 예술의전당 영상사업부장
전)예술의전당 음향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