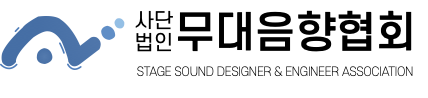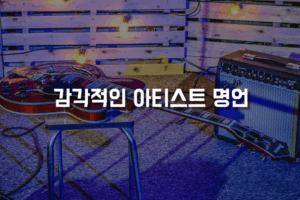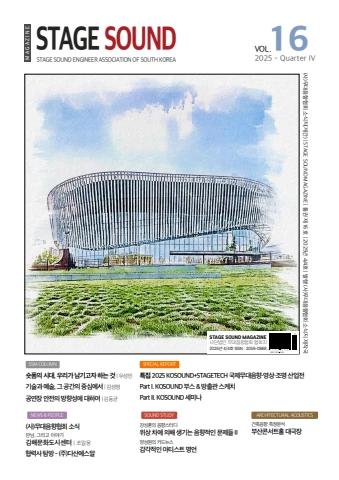기술의 발전은 항상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두려운 미지의 세계를 여는 문이다. 2025년 우리는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 올 절망과 기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 다가올 두려운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 특히 창작이라는 부분에 있어 예술가들에게 AI의 모습은 ‘인자한 얼굴로 중생의 평안한 삶을 기원하면서, 다른 한 얼굴로 자비 없이 중생들을 심판하는 아수라’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자비의 도구로,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삶의 터전을 밟아버리는 공인된 폭력인 셈이다.
3년간 박사과정에서 죽을 힘을 다해 전통적인 신호 처리기반의 소음 처리를 연구한 한 박사과정의 연구가, 기업이 주도하는 데이터 기반의 소위 end-to-end AI모델들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지적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일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녀, 내 조카 혹은 가까운 누군가의 이야기이다.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도 ‘AI 시대의 창작이란 무엇인가’하는 본질적인 고민이 성숙해 가기도 전에 이미 AI를 활용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주류 미디어 진출이 진행되는 현실을 보고 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려움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기술이 우리 사회로 들어올 매번 그 시점마다 기술에 대한 두려움은 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사진 기술이 처음 발명되어 사람들에게 소개되었을 때 회화 작가들이 가졌던 의견은 보편적으로 통일되었다. ‘사진은 예술이 아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고, 그 해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나의 심상의 팔레트를 상상하고, 동시에 그 팔레트안에 나만의 나레티브를 채워나가는 일련의 총체적 행위의 합으로 보았다. 그런 모든 시간을 하나로 압축해서 1초도 걸리지 않아서 담아지는 시각 정보를 어떻게 예술이라 할 수 있었을까? 지금 필자가 생각해도 당시 작가들의 반발은 당연하게 들린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진이 찰나의 순간을 담아내는 힘에 담긴 예술을 향유한다. 반대로 시간을 압축해서 의미 있는 시각 정보를 담아내는 인간의 예술력(藝術力)이야 말로 예술적인 상상력에 기반한 창의력이 합쳐진 결과물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무엇이란 말인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기존의 회화 기반의 예술이 가지는 깊이를 사진 예술을 통해서 더 넓고 심오하게 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이 시대는 기술에 기인한 ‘기존’에 대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창의력의 원동력으로 기성과 결별하는 것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예술인이 중심에 서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구스타프 클림프를 중심으로 한 ‘빈 분리학파(Wiener Secession)’들은 기존 화풍의 흐름에 반대하고 새로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꿈꾸며 행동으로 실천해 나갔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기에 만약 새로운 기술이 예술가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해방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을 위한 기술의 존재 이유가 되어온 것이다.
단지 걱정하는 바는 AI 기반 예술의 주체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하며, AI가 구축한 예술 세계를 나중에 작가가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자신의 정신세계인양 둘러대는 위선을 막는 검증 장치들은 계속 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러한 AI 작품을 검증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트가 등장할지도 모를(아니 어쩌면 이미 있을지도 모를)일이다.
이런 논쟁은 음악과 녹음이라는 기술의 만남에 있어도 계속되어 왔다. 음악은 주어진 공간과 시간이라는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예술이었고, 전통적으로 동일한 연주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반복해서 연주한다고 해도, 두번째 연주가 첫번째 연주와 동일한 예술 작품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지휘자들과 연주자들은 자연스럽게 녹음된 연주가 영원히 남아 하나의 경전과 같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뮤지션들의 이러한 부담감에 힘을 보탠 것은 전통적인 공연 예술에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던 기술자들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신기술이 자신들의 직장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집중하고 새로운 녹음 기술을 악마화한다. Siegen대학의 D. Schrey 교수가 2021년에 쓴 논문[1]에 초기 녹음 기술에 대한 미국 음악가 연맹(AFM, American Federation of Musicians)의 반응이 소개되어 있다.
이들은 1930년대 초에 영화관 내 녹음 음악(“canned music”) 및 기계화된 음악(“robot music”)에 반발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렸다. (저작권 문제로 이 글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위 논문 속에 포함된 “THE ROBOT SINGS OF LOVE, 로봇이 사랑 노래를 부른다고?”라는 식으로 풍자한 캠페인 광고 카피라이트를 찾아보기를 권장한다.) 하지만 그들 중 이 캔과 같이 찍어내어진, 혹은 로봇같이 만들어지는 음악이 그들을 백만장자 대열로 끌고 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음악 소비를 가져왔다. 아마도 그러한 기술력과 예술력을 조합하는 빠른 움직임을 가졌던 사람들은 AFM과 별도로 움직여 그러한 새로운 시장을 선점했다.
동시에 20세기 초의 녹음 기술의 도입이 현재의 AI기술의 임팩트가 같은 규모일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쓴 것처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누구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교에서 소위 가르친다는 나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온라인에 있는 동영상 강좌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되물어보면 회의적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나의 일 자체도 ‘AI 교수로 곧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상상해보기도 한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필자와 같이 무대 혹은 녹음 음향에 관한 전문가로 살아온 사람들일 것이다. 기술의 새로운 물결은 우리로 하여금 20세기 초반의 미국 AFM과 같이 (혹은 최근의 헐리우드 작가 협회가 AI 극본에 대해서 반대하는 파업을 하는 것과 같이) 반 기술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과 예술, 그 공간의 중심에 선 사람들만이 새로운 물결을 타고 살아남았던 것은 이미 위의 여러가지 예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제 앞으로의 무대 음향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로봇화된 마이크 위치 시스템 활용으로 보조 엔지니어가 한 명도 필요하지 않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어느 오케스트라와 어느 공연장에게 최적화된 녹음 위치를 바로 찾아주는 시스템이 나올지도 모른다. 공연장 음향팀이 단 한명이 되는 (아니면 전체 공연장 테크 팀이 단 한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런 암울한 미래에 대한 필요 없는 상상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여 소위 평생 자신을 새롭게 교육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변화의 시대에 오히려 더 나은 기회의 땅에 랜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가 예기한 평생 학습(lifelong learning)과 변화를 통한 항상성 유지(Change is the only constant)를 이제는 우리 무대 음향에도 적용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와 항상성을 선도해 무대 음향의 전선에서 기술과 예술, 그 공간의 중심에서 위치할 독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이 SSM 매거진이 이러한 우리를 위한 평생 학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성영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로체스터 공과대학 부교수 (2018-)
로체스터 공과대학 조교수 (2012-2018)
(주)야마하 연구원 (2007-2012)
한국방송공사 엔지니어 (KBS)(1996-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