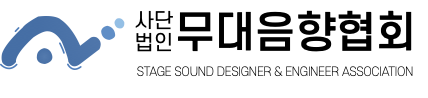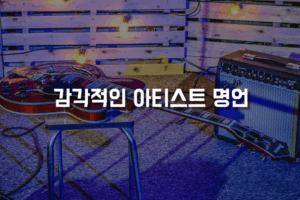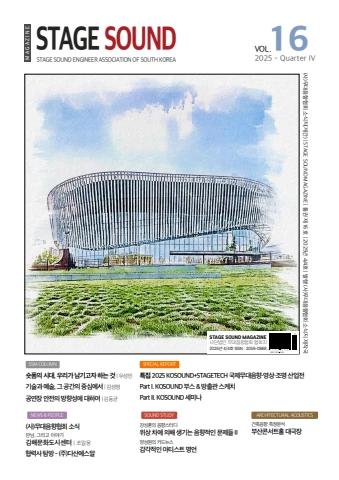오케스트라 레코딩 기법, 어떻게 할 것인가?
무대음향협회 기술위원 성재훈 감독
- 클래식 녹음에 정답이 없지만, 정답을 찾아가는 길은 분명하다고 믿는 무대음향협회 기술위원 성재훈감독이 전하는 세미나 <오케스트라 레코딩 기법, 어떻게 할 것인가?>. 귀와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과정, 기술과 음악적 감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성재훈 감독은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와 통찰을 직접공유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극장 음향감독, 성재훈입니다. 그동안 오케스트라와 클래식 공연의 녹음, 방송 중계, 홀 음향 설계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최근에는 ‘극장 환경에서의 오케스트라 녹음’을 주제로, 실제 공연장 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이킹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사운드 세미나에서도, 그동안의 실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오케스트라 레코딩 기법,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오케스트라 녹음이 다른 장르 녹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이며, 녹음환경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케스트라 녹음의 본질은 ‘공간을 녹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음악처럼 개별 트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홀 전체의 울림과 악기 간의 거리감,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공기의 질감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녹음 환경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은 전체 인상(명료함, 포근함, 풍부함), 공간감(잔향감, 확산과 깊이감), 위치감(악기군의 배치와 분리),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기술적 요소가 아니라 음악을 어떻게 ‘그 장소에서 들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마이킹 기법(Decca Tree, ORTF, NOS, AB 등) 중 실제 공연장에서 가장 자주 활용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극장에서는 데카 트리(Decca Tree) 방식을 가장 자주 사용합니다. 무지향성 마이크 세 개를 삼각형 형태로 배치한 이 방식은, AB 방식의 장점인 깊은 공간감과 센터 마이크의 안정적인 위치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B만 사용하면 중앙이 비어 보이는 ‘홀 인 더 미들(hole in the middle)’ 현상이 생기는데, 데카 트리는 그 문제를 보완하면서 더욱 균형 잡힌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실제 공연장처럼 잔향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아웃트리거(Outrigger)를 함께 사용해 양측 스트링과 저주파 에너지를 보강하면, 오케스트라 전체의 스케일이 훨씬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동일한 녹음 기법이라도 공연장 규모, 잔향 특성, 흡음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잘 살리기 위해 오케스트라와 마이크 거리, 아웃트리거 배치를 어떻게 조정하시고, 최적 환경을 찾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먼저 공연장의 잔향과 악단의 배치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 마이크 시스템이 ITU-R BS.775의 스테레오 기준(±30°) 안에서 청취될 때 자연스러운 공간감을 만들 수 있도록 거리와 높이를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휘자 뒤쪽 약 3~4m 높이, 폭은 약 1.5m 간격으로 데카 트리를 설치합니다. 그 후 좌우 끝단의 음상이 중앙으로 모이지 않도록, 셍피엘(Sengpiel)의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해 SRA(Stereo Recording Angle)를 미리 계산합니다.
아래 QR코드를 링크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측면 스트링이나 콘트라베이스가 홀 벽에 묻히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를 추가해 스테레오 폭을 확장하고 저역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거리’보다 ‘귀로 들리는 거리’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감각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화하면서 오케스트라 녹음 방식에 가져온 변화가 있을까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절에는 공간을 ‘감으로’ 잡았다면, 지금은 디지털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공간의 음향 특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RA 계산기, 임펄스 응답 분석, 스펙트럼 비교 같은 디지털 툴은 마이크 간 시간차(ITD)와 레벨차(ILD)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게 해줍니다. 덕분에 ‘감’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데이터로 설득할 수 있는 녹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귀로 확인하는 감각적 판단이 마지막 기준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녹음하는 상황에서 겪으신 어려운 순간과 이를 해결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홀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지 못했을 때’입니다. 한 번은 대형 공연장에서 ORTF만으로 녹음을 진행했는데, 녹음된 음상이 중앙으로 쏠리고 양 끝이 답답하게 들리고 저음도 약하게 들렸습니다. 이후 데카 트리와 아웃트리거 마이크를 추가해 저역 확산과 좌우 분리감을 보완하자 전체가 훨씬 넓게 열리고 밸런스가 잡혔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오케스트라 음악은 단일 지향성 마이크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구나.’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마이크 방식을 바꾸고, 마이크를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걸요.

최근에는 이머시브 오디오, 오브젝트 기반 믹싱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오케스트라 레코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영향이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머시브 오디오는 단순히 다채널의 확장이 아니라, 공간의 깊이와 높이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오케스트라 녹음에 적용한다면, 지휘자의 시점뿐 아니라 청중석, 혹은 무대 위 연주자의 위치에서 들리는 입체적인 사운드를 재현할 수 있겠죠. 다만 클래식 녹음에서는 ‘기술이 음악을 앞서지 않아야 한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술은 표현을 돕는 도구일 뿐, 음악의 중심은 여전히 연주자와 홀의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무대음향협회 회원과 협회지 SSM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클래식 녹음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정답을 찾아가는 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귀와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과정, 기술과 음악적 감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극장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현장에서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레전드 기술’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구와 공유를 통해, 무대음향 분야가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소리를 만들어갈 수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