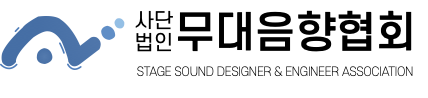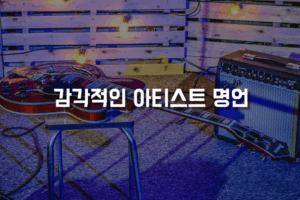최근 무대음향협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리모델링을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다. 신축보다 더 어렵다는 공연장 리모델링. 그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꼬박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쏟아부었다. 매 순간이 고비였고, ‘이제는 정말 더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집요하게 실행한 결과, 다행히도 대관자와 운영자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리모델링의 성과도 성과지만, 그 이상으로 소중했던 건 그 지난했던 과정의 기록이었다. 준비부터 시작, 마무리까지의 모든 순간을 페이퍼와 사진, 영상으로 남겼다.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 완벽한 설계를 위한 수백 장의 스케치와 아이디어들, 예기치 못한 변수, 해결을 위한 치열한 고민까지도 고스란히 담아냈다. 만약 이 기록이 없었다면, 그 오랜 시간의 경험과 고민은 기억의 파편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결과만 남고, 과정은 잊히는 것. 그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였다.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었지만, 좋은 기회가 주어져 그런 기록을 바탕으로 강의도 할 수 있었고 협회원들과 소중한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었다. 비록 개인적인 기록이었지만 정제되고 다듬어진 자료들은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와, 지적인 자산의 형태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 사례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SSM은 공연장의 현장을 지켜낸 감독들의 생생한 경험이 집단으로 기록되는 총합체이며,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협회의 유산이 되고 있다.
동료 선후배 감독들로부터 “SSM을 통해 공연장 운영에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감동을 느낀다. 그것은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기록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작동’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기록은 곧 문화이고 문명이다. 인류의 역사는 곧 기록의 역사였고, 기록이 없는 시대는 단절의 시대이다. 그만큼 기록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같은 장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SSM은 협회의 세대를 연결하는 가장 확실한 매개체이자, 앞으로도 그 역할을 지속해야 할 플랫폼이다.
개관한 지 30여 년이 넘은 공연장들이 속속 리모델링의 시기로 접어드는 것처럼, 공연 현장에서도 세대교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공공 공연장의 1세대를 이끌어온 선배들이 하나둘 은퇴를 맞이하고, 그분들이 공연장 생활을 시작할 무렵 갓 태어났던 80~90년대생 후배들이 이제는 협회의 주축이 되어가고 있다.
구구절절 예로 들었던 리모델링의 사례에서 보듯 이제 SSM은 이미 협회에서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구전으로 늘어놓는 무용담이 아닌, 축적된 텍스트와 자료로 남겨진 기록들이 세월을 뛰어넘으며 협회의 역사와 경험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멈추지 않는다, 아니 멈출 수가 없다. 다음 디딤돌을 누군가는 또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열다섯 번째 다리를 조심히 또 놓아본다. ![]()